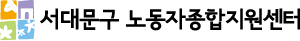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22232015&code=940702
지난 8일 쿠팡, 우체국,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영국 감독 켄 로치의 신작 <미안해요, 리키(Sorry, we missed you)> 상영회에 참석했다. 수입·배급을 맡은 영화사 진진이 서대문구근로복지센터가 진행하는 노동인권문화제에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12월 개봉할 영화를 사전 공개했다. 켄 로치는 아일랜드 독립투쟁을 그린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2006), 복지제도의 허점을 그린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2회 수상하는 등 진보적 이슈를 꾸준히 다뤄왔다.
영화는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택배회사에 취직한 40대 남성 리키에 대한 이야기다. 제조업 몰락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영국의 중소도시 뉴캐슬이 배경이다. 배달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리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난다. 일할수록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가족과도 불화를 겪는다. 리키는 가정을 지키려 위험한 일터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굴레에 갇힌다.
“참 신기했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인데 일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이 말했다. 고강도 상하차 작업, 작업을 통제하는 개인정보단말기(PDA), 다쳐도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 인간다운 삶은커녕 생명을 위협당하는 한국의 현장이 겹쳐 보였다. ‘한국의 리키’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1. “계약하는 게 아니라 합류하는 거야” “당신은 ‘오너’ 드라이버야. 이곳엔 임금은 없고, 수수료만 있어”
프랜차이즈 택배업체 ‘PDF(Parcels Delivered Fast)’에 면접을 보러 간 리키에게 물류창고 관리인이 말한다. 리키는 물류창고에서 자신이 담당한 지역에 택배를 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법적으로 프랜차이즈 자영업이지만 사실상 가맹본부 지휘 아래 일한다. 다단계 판매처럼 초기 비용도 든다. 배달 차량을 직접 구매해야 한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업무상 문제가 발생해도 회사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 면접 장면을 보는 순간 영화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견했어요. 노동자의 지위였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죠.” 쿠팡 배달노동자 조찬호씨는 기업이 ‘책임 없는 고용’으로 몸집을 키우고, 배달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가장해 착취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박성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은 한국도 비슷한 처지라고 설명했다. 택배 일을 시작할 때 직접 차량을 구매하고 도색까지 원청 지시에 따른다. 물품이 파손되면 배달노동자가 배상해야 한다. 박 지부장은 “여전히 송장이나 박스테이프 같은 기본 비용조차 택배노동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송서경씨는 한국 사회가 플랫폼의 등장 이후 노동을 ‘노동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지적했다. 법과 제도 아래 보호받아 마땅한 ‘불안정한 노동’을 마치 ‘자유로운 업무환경’으로 묘사해 저임금·단기 배달노동자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뜻이다. 송씨는 ‘날씨 좋은 날 소풍 다니듯, 드라이브하듯 일한다’는 쿠팡플렉스 광고문구를 예로 들었다. 조씨는 “쿠팡플렉스 등 신생 배달사업은 론칭할 때 프로모션을 거창하게 해 인력을 확보한 뒤, 수요·공급을 이유로 수수료를 줄이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다.
#2. “너도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거야” “이 조그만 기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잘 챙겨”
택배사업을 시작한 리키에게 동료는 ‘필수품’을 건넨다. 비상시에 대비한 빈 페트병이다. “난 이런 거 필요 없다”며 웃던 리키는 결국 필수품을 소변통으로 사용한다. 물류창고 관리인은 또 다른 ‘필수품’을 쥐여준다. 배달정보, 배달원 위치, 도착 예정시간을 실시간으로 담고 있는 PDA다. 움직이지 않은 채 2분이 지나면 곧바로 경고음이 울린다. “삐삐.”
휴식·식사시간 없는 주인공
‘필수품’ 페트병 찾는 모습에
“나도 겪어본 일…물 안 마셔”
배달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일하는 환경’이라고 표현했다. 배달노동자의 배송 일과를 담는 ‘배송로직’에 노동자의 사정은 담기지 않는다. 쉴 시간이나 식사할 시간 없이 배달·이동 동선으로 꽉 짜여 있다. 배달 시간에 쫓기던 리키가 페트병을 찾는 모습에도 “한번씩 겪어본 일”이라며 공감했다. 배달노동자들은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보니 물을 안 마시는 습관까지 생겼다.
“배달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요.” 최 위원장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업무 시스템이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컨베이어벨트 속도를 높이면 생산량을 높일 수 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택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은 초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총물량’을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우편 1통 처리 시간은 2.1초, 등기 우편은 2.8초 식이다. 소포는 30초마다 하나씩 배달된다고 간주한다. 최 위원장은 “우정본부는 이 기준에 따르면 인력이 남는다고 한다”며 “현장에선 허리 펼 시간조차 없는데, 이런 열악한 현실을 사용자와 자본은 자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집배원 오토바이 바구니에 식사로 보이는 음식이 담겨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3. “젖소 키우는 농장주가 휴가 있는 것 봤나” “어쩔 수 없어. 일하러 가야 한다고!”
리키는 아들이 정학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전화를 받는다. 가족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리키는 휴가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어느 날 택배를 훔치려는 일당이 나타나 리키를 폭행한다. 상처투성이가 된 리키는 병원에서 물류창고 관리인의 전화를 받는다. “파손 택배 배상, 하루치 배달 못한 수수료 2배 변상, 벌점 부과.” 한번 더 결근하면 일자리를 잃게 될 리키는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픈 몸으로 차에 탄다.
배달노동자들은 수많은 ‘한국의 리키’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에 집계도 되지 않는다. 배달하다 사고를 당해도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휴가를 낼 수도 없다.
책임 없는 고용 ‘개인’ 착취
사고당해도 회사는 외면해
반깁스 하고 다시 배달까지
박 지부장은 반깁스를 하고도, 아버지 제사를 치르고도 업무에 복귀하곤 했다. “계약관계가 아닌 하도급 관계로, 자기 사업인 만큼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했다.
조씨는 “쿠팡맨은 그나마 4대보험에 가입돼 사정이 낫다”면서도 “연차를 준다고 홍보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원래 주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12시간 일하면 배달하면서도 존다”며 “가족들이 서로를 지키려 무던히 애쓰지만, 배달노동의 형태가 가족공동체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달노동자들은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로 꼽았다. 노동으로 가정이 파탄나지 않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불안한 고용으로 내몰리는 배달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비정상적인 근로 형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처방할 게 아니라, 잘못된 고용·노동 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22232015&code=940702#csidx1da128fd21f56889e7a00cbfa0086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22232015&code=940702
지난 8일 쿠팡, 우체국,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영국 감독 켄 로치의 신작 <미안해요, 리키(Sorry, we missed you)> 상영회에 참석했다. 수입·배급을 맡은 영화사 진진이 서대문구근로복지센터가 진행하는 노동인권문화제에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12월 개봉할 영화를 사전 공개했다. 켄 로치는 아일랜드 독립투쟁을 그린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2006), 복지제도의 허점을 그린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2회 수상하는 등 진보적 이슈를 꾸준히 다뤄왔다.
영화는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택배회사에 취직한 40대 남성 리키에 대한 이야기다. 제조업 몰락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영국의 중소도시 뉴캐슬이 배경이다. 배달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리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난다. 일할수록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가족과도 불화를 겪는다. 리키는 가정을 지키려 위험한 일터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굴레에 갇힌다.
“참 신기했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인데 일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이 말했다. 고강도 상하차 작업, 작업을 통제하는 개인정보단말기(PDA), 다쳐도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 인간다운 삶은커녕 생명을 위협당하는 한국의 현장이 겹쳐 보였다. ‘한국의 리키’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1. “계약하는 게 아니라 합류하는 거야” “당신은 ‘오너’ 드라이버야. 이곳엔 임금은 없고, 수수료만 있어”
프랜차이즈 택배업체 ‘PDF(Parcels Delivered Fast)’에 면접을 보러 간 리키에게 물류창고 관리인이 말한다. 리키는 물류창고에서 자신이 담당한 지역에 택배를 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법적으로 프랜차이즈 자영업이지만 사실상 가맹본부 지휘 아래 일한다. 다단계 판매처럼 초기 비용도 든다. 배달 차량을 직접 구매해야 한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업무상 문제가 발생해도 회사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 면접 장면을 보는 순간 영화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견했어요. 노동자의 지위였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죠.” 쿠팡 배달노동자 조찬호씨는 기업이 ‘책임 없는 고용’으로 몸집을 키우고, 배달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가장해 착취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박성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은 한국도 비슷한 처지라고 설명했다. 택배 일을 시작할 때 직접 차량을 구매하고 도색까지 원청 지시에 따른다. 물품이 파손되면 배달노동자가 배상해야 한다. 박 지부장은 “여전히 송장이나 박스테이프 같은 기본 비용조차 택배노동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송서경씨는 한국 사회가 플랫폼의 등장 이후 노동을 ‘노동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지적했다. 법과 제도 아래 보호받아 마땅한 ‘불안정한 노동’을 마치 ‘자유로운 업무환경’으로 묘사해 저임금·단기 배달노동자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뜻이다. 송씨는 ‘날씨 좋은 날 소풍 다니듯, 드라이브하듯 일한다’는 쿠팡플렉스 광고문구를 예로 들었다. 조씨는 “쿠팡플렉스 등 신생 배달사업은 론칭할 때 프로모션을 거창하게 해 인력을 확보한 뒤, 수요·공급을 이유로 수수료를 줄이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다.
#2. “너도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거야” “이 조그만 기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잘 챙겨”
택배사업을 시작한 리키에게 동료는 ‘필수품’을 건넨다. 비상시에 대비한 빈 페트병이다. “난 이런 거 필요 없다”며 웃던 리키는 결국 필수품을 소변통으로 사용한다. 물류창고 관리인은 또 다른 ‘필수품’을 쥐여준다. 배달정보, 배달원 위치, 도착 예정시간을 실시간으로 담고 있는 PDA다. 움직이지 않은 채 2분이 지나면 곧바로 경고음이 울린다. “삐삐.”
휴식·식사시간 없는 주인공
‘필수품’ 페트병 찾는 모습에
“나도 겪어본 일…물 안 마셔”
배달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일하는 환경’이라고 표현했다. 배달노동자의 배송 일과를 담는 ‘배송로직’에 노동자의 사정은 담기지 않는다. 쉴 시간이나 식사할 시간 없이 배달·이동 동선으로 꽉 짜여 있다. 배달 시간에 쫓기던 리키가 페트병을 찾는 모습에도 “한번씩 겪어본 일”이라며 공감했다. 배달노동자들은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보니 물을 안 마시는 습관까지 생겼다.
“배달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요.” 최 위원장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업무 시스템이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컨베이어벨트 속도를 높이면 생산량을 높일 수 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택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은 초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총물량’을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우편 1통 처리 시간은 2.1초, 등기 우편은 2.8초 식이다. 소포는 30초마다 하나씩 배달된다고 간주한다. 최 위원장은 “우정본부는 이 기준에 따르면 인력이 남는다고 한다”며 “현장에선 허리 펼 시간조차 없는데, 이런 열악한 현실을 사용자와 자본은 자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집배원 오토바이 바구니에 식사로 보이는 음식이 담겨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3. “젖소 키우는 농장주가 휴가 있는 것 봤나” “어쩔 수 없어. 일하러 가야 한다고!”
리키는 아들이 정학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전화를 받는다. 가족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리키는 휴가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어느 날 택배를 훔치려는 일당이 나타나 리키를 폭행한다. 상처투성이가 된 리키는 병원에서 물류창고 관리인의 전화를 받는다. “파손 택배 배상, 하루치 배달 못한 수수료 2배 변상, 벌점 부과.” 한번 더 결근하면 일자리를 잃게 될 리키는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픈 몸으로 차에 탄다.
배달노동자들은 수많은 ‘한국의 리키’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에 집계도 되지 않는다. 배달하다 사고를 당해도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휴가를 낼 수도 없다.
책임 없는 고용 ‘개인’ 착취
사고당해도 회사는 외면해
반깁스 하고 다시 배달까지
박 지부장은 반깁스를 하고도, 아버지 제사를 치르고도 업무에 복귀하곤 했다. “계약관계가 아닌 하도급 관계로, 자기 사업인 만큼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했다.
조씨는 “쿠팡맨은 그나마 4대보험에 가입돼 사정이 낫다”면서도 “연차를 준다고 홍보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원래 주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12시간 일하면 배달하면서도 존다”며 “가족들이 서로를 지키려 무던히 애쓰지만, 배달노동의 형태가 가족공동체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달노동자들은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로 꼽았다. 노동으로 가정이 파탄나지 않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불안한 고용으로 내몰리는 배달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비정상적인 근로 형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처방할 게 아니라, 잘못된 고용·노동 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22232015&code=940702#csidx1da128fd21f56889e7a00cbfa008602